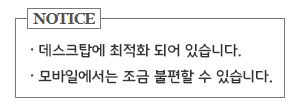제목 : 아주 오래된 농담
작가 : 박완서
출판 : 실천문학사 , 세계사
발매 : 2000.10.26 , 2012.01.22
01 책 소개
한국문학 최고의 유산인 박완서를 다시 읽는 「박완서 소설전집」 제21권 아주 오래된 농담. 1931년 태어나 마흔 살이 되던 1970년 장편소설 <나목>이 여성동아 여류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한 저자의 타계 1주기를 맞이하여 출간된 장편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의 결정판이다.
2011년 타계하기까지 쉼 없이 창작 활동을 펼쳐온 저자가 생애 마지막까지 직접 보고 다듬고 매만진 아름다운 유작이기도 하다.
돈 혹은 자본주의에 대한 복합적이고 모순적 태도를 고발한다.
초판본에 실린 서문이나 후기를 고스란히 옮겨 실어 저자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수 있다.
특히 소박하고, 진실하고, 단순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 저자의 삶은 물론, 그를 닮은 작품 세계를 배우게 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02 아주 오래된 농담 리뷰
처음 박완서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그녀의 이름은 어딘지 모르게 구수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었지만, TV에 소새 된 바 있는 책들의 배경들은 60-70년대가 주 배경이었던 탓이다.
게다가 노란 표지와 아주 오래된 농담이란 제목은 더욱 느낌을 가득 심어주었다.
하지만 느낌과는 전혀 다른 책이었다.
사실, 처음엔 잘 읽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거기엔 계속해서 1인칭 시점의 책을 봐온 탓도 있었겠지만 그녀의 무체는 익숙해지기 전까지 어떤 거부감이 들었다.
뭐랄까? 현대적 작가들의 개성 있는 문체와는 차별되는 연륜이 묻어나는 느낌이랄까? 물론, 편견으로 시작된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 느낌은 책을 읽는 첫 마음을 제법 무겁고 지루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다.
사실 이 책은 읽는 내내 단 한 번도 가벼움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시종일관 위태위태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끝끝내에도 무겁게 모순적이고도 비판적으로 끝맺은 게 사실이니까 말이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무언가에 대한 싸늘한 웃음과 위로라는 느낌이 가득 들었다.
게다가 영빈의 느낌과 똑같이 송 씨 일가의 그 위선적인 작태에선 지독 하리만큼의 혐오감도 느껴졌다.
아주 오래된 농담이란 제목은 어찌 보면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내려오는 시대적 문제점과 정서적 문제점들에 대한 정면적 비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지나치게 통속적이고 흔한 소재였다는 점은 뭐랄까? 소설 속에 무언가 독특하게 마음을 이끄는 매력을 심어주진 못했다.
예컨대 박민규의 마치 4차원적인 문체나 은 연속에 등장하는 비판과 재치, 또는 은희경 식의 냉소와 문장 속 통렬한 비판 같은 양념들이 꽤 부족했단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그랬기에 책을 읽는 내내 솔직히 '재미있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 어찌 보면 제법 밋밋한 느낌도 들었다.
게다가 피부와 와 닿는 현실적 사건들보단, 드라마에서 자주 봐왔던 소재들이 눈앞에 가득했던 탓일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크게 영빈과 어린 시절 친구인 현금 사이의 불륜, 그리고 영빈의 여동생 영묘와 송 씨 일가 사이의 이야기로 나뉘다.
하지만 소설 속 주인공은 영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영묘와 송 씨 일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으로 번진 점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현대적으로도 계속해서 부딪혀야만 할 가치판단의 문제, 환자에게 자신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단 점을 알려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사이의 가치판단 문제를 송 씨 일가의 돈과 결부시켜 자본주의 사회의 지독한 모순에 대한 비판은 좋았지만 영묘의 남편인 경호의 죽음은 이미 예견되었단 점과 그가 죽을 것이란 사실은 처음부터 의심이 들지 않게 했고 그가 죽어가는 모습은 지나치게 단조로웠던 점은 재미라는 측면을 살리지 못한 부분이었다.
또한 영빈과 현금 사이에서 벌어진 불륜은 갈등관계가 깊지도 복잡하지도 않았다.
단지, 소설 속 흥밋거리를 위해 등장했단 느낌만 들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는 특별한 갈등 없이 너무나 평안하고도 원만하게 끝이 났기 때문이다.
다만, 이 소설은 현시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아니, 이미 겪어온 문제들에 대한 노골적 비판 의식도 담겨있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딸이 둘인 영빈의 처는 그 사실 때문에 영빈의 어머니 앞에서 항상 기를 펴지 못하고 늘 아들을 갖고 싶어 하는 사실이나, 영빈의 동생 영묘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돈 한 푼 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회 속 희생양으로써의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책을 읽는 내내 단조로운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큰 흥미를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 소설 후반부까지도 수수께끼의 인물처럼 등장했던 영빈의 형이 해결사처럼 등장하여 그들 사이의 모든 문제점을 풀어놓는 열쇠 역할을 했다는 건 특별히 비판할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 마저도 약한 갈등관계에 너무도 원만한 사건 해결이란 느낌을 들게 만들었다.
다만, 자본주의와 결부되지 않은 가족사에 대해선 꽤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다.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가족애는 날이 갈수록 딱딱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송 씨 일가의 모습은 오로지 돈과 결부시켜 그 가족애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만들어 놓을 만큼 혐오스러웠지만 그래서 누이에게 더 정을 쏟는 영빈의 모습은 좀 더 가족애의 측면을 살린 면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빴던 것도 아니었던 책이었다.